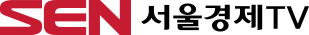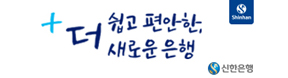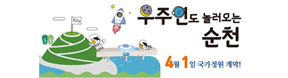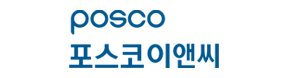[만파식적] 탄저균
입력 2015-05-28 20:56:09
임석훈 논설위원 기자
0개
1979년 4월 옛소련 군수산업의 중심지였던 스베르들롭스크(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수백명이 한꺼번에 죽는 사고가 발생한다. 냉전 시대 정보가 철저히 봉쇄된 탓에 미국조차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다. 수많은 정보 채널을 가동해도 소용없자 지미 카터 대통령까지 나서 소련에 자초지종을 밝혀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소련 정부의 해명은 시민들이 탄저균에 감염된 소를 먹어서 빚어진 사태라는 것. 도축업자가 탄저병에 걸린 소를 도축해 판매했고 이를 섭취한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둘러댄 것이다. 그렇게 묻힌 것 같던 사고의 진실은 13년 후인 1992년에야 드러난다. 미국으로 망명한 당시 소련 생화학무기연구소 총책임자 켄 알리베크를 통해서다.
그는 생화학무기로 개발한 탄저균이 외부로 유출돼 대량 인명피해가 생겼다고 폭로했다. 탄저균은 탄저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대표적 생물학무기로 알려져 있다. 공식 명칭은 바실루스안트라시스(Bacillus Anthracis)로 흙 속에 서식하는 세균이다. 감염 후 발병 하루 안에 항생제를 다량 복용하지 않으면 80%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살상능력이 뛰어나다.
탄저균 100㎏을 대도시 상공에 살포할 경우 최대 300만명을 해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무기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1·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과 미국·일본·소련·영국 등이 경쟁적으로 탄저균을 생물학무기로 개발했다. 특히 영국이 스코틀랜드 북부의 그뤼나드섬에서 실시한 탄저균 폭탄 실험과 일본 731부대의 생체 탄저균 실험은 유명하다.
전시에만 탄저균 공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의 옴진리교 사건, 미국 9·11테러 이후 발생한 우편 테러에 탄저균이 이용되기도 했다. 최근 미군 연구소에서 살아 있는 탄저균을 오산 주한미군기지 등에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실험요원들이 노출됐지만 감염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니 다행스럽다.
'메르스' 환자가 늘어나는 마당에 탄저균 소식까지 불거지니 괜스레 걱정이다.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려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게 최선이다.
임석훈 논설위원
소련 정부의 해명은 시민들이 탄저균에 감염된 소를 먹어서 빚어진 사태라는 것. 도축업자가 탄저병에 걸린 소를 도축해 판매했고 이를 섭취한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둘러댄 것이다. 그렇게 묻힌 것 같던 사고의 진실은 13년 후인 1992년에야 드러난다. 미국으로 망명한 당시 소련 생화학무기연구소 총책임자 켄 알리베크를 통해서다.
그는 생화학무기로 개발한 탄저균이 외부로 유출돼 대량 인명피해가 생겼다고 폭로했다. 탄저균은 탄저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대표적 생물학무기로 알려져 있다. 공식 명칭은 바실루스안트라시스(Bacillus Anthracis)로 흙 속에 서식하는 세균이다. 감염 후 발병 하루 안에 항생제를 다량 복용하지 않으면 80%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살상능력이 뛰어나다.
탄저균 100㎏을 대도시 상공에 살포할 경우 최대 300만명을 해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무기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1·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과 미국·일본·소련·영국 등이 경쟁적으로 탄저균을 생물학무기로 개발했다. 특히 영국이 스코틀랜드 북부의 그뤼나드섬에서 실시한 탄저균 폭탄 실험과 일본 731부대의 생체 탄저균 실험은 유명하다.
전시에만 탄저균 공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의 옴진리교 사건, 미국 9·11테러 이후 발생한 우편 테러에 탄저균이 이용되기도 했다. 최근 미군 연구소에서 살아 있는 탄저균을 오산 주한미군기지 등에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실험요원들이 노출됐지만 감염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니 다행스럽다.
'메르스' 환자가 늘어나는 마당에 탄저균 소식까지 불거지니 괜스레 걱정이다.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려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게 최선이다.
임석훈 논설위원
[ⓒ 한국미디어네트워크(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