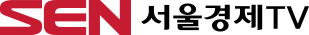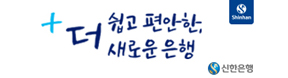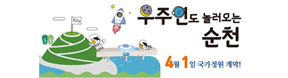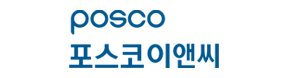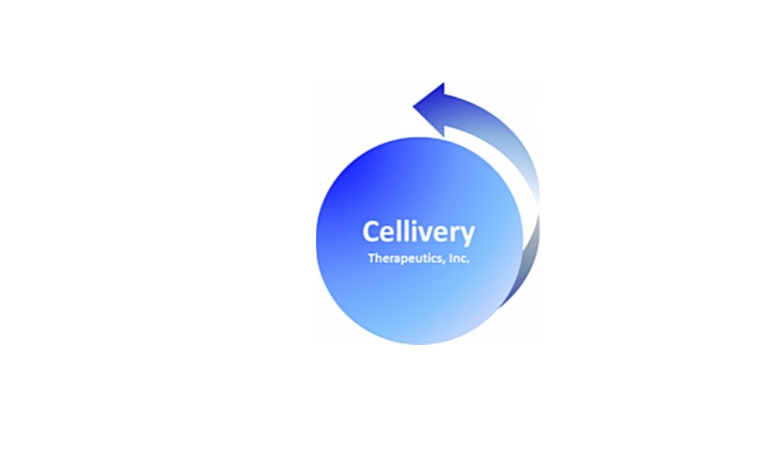조대웅 셀리버리 대표 “글로벌 신약 위한 여정…데이터로 가치 증명”

“신약은 후보물질을 도출하기도 어렵지만 안전하고 치료 효능이 있다는 것을 법 테두리 안에서 증명하는 개발단계도 매우 어렵다.”
코스닥 상장기업 셀리버리의 조대웅(사진) 대표는 신약개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작년 겨울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셀리버리는 글로벌 신약 개발에 대한 조대웅 대표의 열정에 힘입어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조대웅 대표에게 향후 셀리버리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조대웅 대표는 “동물에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수준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증명하는 과정이 비임상시험”이라며 “셀리버리의 후보물질은 이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셀리버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묻는 질문에 조 대표는 “신약을 전세계 시장에 내놓고 이를 아픈 환자에게 투여해 생명 연장과 생명 보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 대표는 바이오벤처 업계 현실의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우리 현실에서 최선은 생산·공급·처방·유통 그리고 마케팅네트워크가 있는 글로벌 제약사에 라이센싱아웃(L/O)을 하는 것”이라며 “라이센싱이 안 되면 국내 신약으로 머물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셀리버리 같은 국내 네트워크도 없는 바이오벤처사의 신약후보물질은 중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개발된 국내 신약 29종 중 1/3은 이미 시장에서 사라진 안타까운 상황이고 글로벌 신약은 전무하다”며 “‘카나브(보령제약)’, ‘제미글로(LG화학)’같은 수백억씩 매출을 올리는 신약도 있지만, 개발자들과 투자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글로벌 신약”이라고 강조했다.
라이센싱 아웃만이 셀리버리와 같은 국내 바이오업체가 약을 개발해 전세계 시장에 팔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조대웅 대표.
그는 “빅파마라고 불리는 글로벌제약사들이 라이센싱인(L/I)을 해주는 회사인데, 이들은 각각 입장이 다르다”며 “어느 제약사는 반드시 비임상 독성 및 유효성 결과가 있어야 하고, 어느 회사는 임상1상 또는 2상 결과를 요구하고, 또 다른 회사는 그것이 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훌륭한 과학적 건전성(scientific integrity)이 있으면 라이센싱을 해간다”고 설명했다. 즉,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자체 임상 3상까지 마치고 전세계 제약시장에서 자력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빅파마들의 요구에 부응해 비임상 또는 임상 데이터를 제공하고 각 단계에 맞는 과학적 역량으로 빅파마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셀리버리는 후보물질을 돈을 주고 사와 그것을 자력으로 끝까지 개발하는 사업모델이 아니고, 독점적인 자체 기술(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로 혁신 신약후보물질을 도출한다”며 “이 단계에서부터 라이센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파트너 빅파마들이 원하는 수준의 비임상 또는 임상 데이터를 제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우리는 비임상까지만 한다’ 또는 ‘우리는 임상을 자체적으로 끝까지 한다’와 같은 고정된 테두리 안에 가두고 사업을 하는 것은 사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형국”이라며 “가장 교과서적이지만 확실한 라이센싱 전략은, 신약후보물질을 만들고 그 가치를 데이터로 증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길”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셀리버리가 진행 중인 복수의 프로젝트가 현재 순항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글로벌 신약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파트너 제약사들에게 라이센싱 아웃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그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셀리버리는 숙지하고 있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조 대표는 신약 개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포기의 연속’이라고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신약개발은 ‘포기의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명한 포기의 연속 속에 만들어진다”며 “시장에 이미 비슷한 약이 있거나 효능이 압도적이지 않다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신약 개발의 한 과정”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어 “‘임상에 진입시킨 후보물질은 모두 다 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신약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한양행에서 신약개발을 배운 조 대표는 최근 유한양행의 L/O 성공사례(비알콜성 지방간 치료제, 베링거잉겔하임)를 예로 들며 “유한에서 신약개발을 배운 유한 출신으로서 대단히 자랑스럽다”며 인터뷰를 끝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