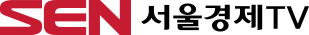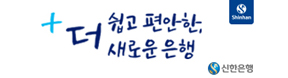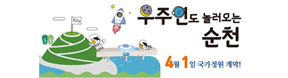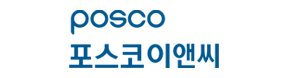[기자의 눈] 제 2의 키코 분쟁 사태 막으려면…

11년 2개월째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울렸던 외환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를 둘러싼 분쟁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달 중순이면 뒤늦게 재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사건 발생 10년이 넘어 이미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시한은 지났다. 규제의 칼을 쥐고 있는 금융 당국의 조정안을 은행이 마냥 거부할 수 없지만 금융사측은 10년이 지난 사건을 왜 다시 끄집어내어 재조사하냐며 불만이 많다.
키코 사태로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제도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구속력있는 중재 권한이 없기때문에 키코처럼 골치아픈 금융분쟁 사건의 경우에 초기에 신속하고 강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러는 사이에 결국 소비자는 금융사를 상대로 힘겹고 복잡한 법원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
키코가 딱 그 꼴이다. 금융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10년 가까이 진행된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키코 사태 발생 후 10년도 더 지난 지금 당국의 수장이 바뀌면서 뒤늦게 재조사하는 형국이다.
금융상품, 특히 파생상품 구조는 너무 복잡해 전문성을 가진 금융당국이 분쟁 조정의 최후 책임을 맡아야 한다. 영국 같은 금융 선진국은 그래서 금융감독기구의 조정 판결이 바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돼 소비자 보호가 빠르고 적확하게 이뤄진다. 이같은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실질적인 독립 감독기구로 거듭나야 한다.
하지만 우리네 감독기구는 집권하는 행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구조다.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통화정책 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처럼 금융감독기구도 독립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개인 소비자나 기업들은 갈수록 고도화하는 자본시장의 특성 때문에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복잡해 자신이 피해를 당했는지조차 모르는 소비자들도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력하고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한 이유다. 키코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금융감독당국도 그동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철학과 자세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키코 사태 취재 과정에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 분쟁 절차 개선을 위해 해외 사례를 모아둔 게 없고, 굳이 왜 해외 사례를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했다.
당국이 진정으로 소비자 보호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이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의 독립성과 철학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 2, 제 3의 키코 분쟁 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