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P2P 업계, 자율규제 마련도 제 각각
증권·금융
입력 2018-08-13 16:42:00
수정 2018-08-13 16:42:00
이아라 기자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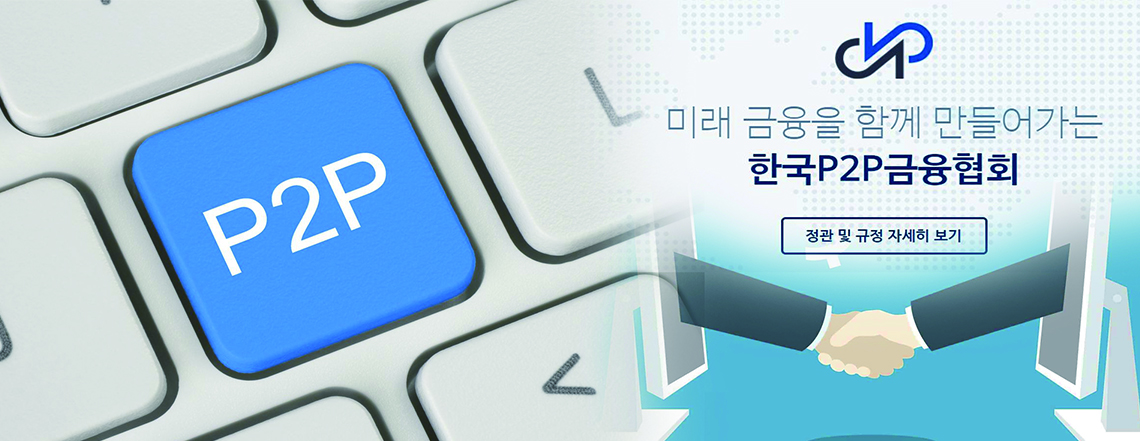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KB금융, '제25회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 대통령상 수상
- 비에이치아이, 2MW급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설비 시연회 성료
- 신한은행 '땡겨요', 서울시 및 11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상생 협약
- IBK證, 부동산 담은 AI자산진단 MTS 서비스 출시
- 한울반도체 “비트로 인수…글로벌 팬덤 비즈니스 진출”
- 키움증권, 낙인배리어 35% 글로벌지수 ELS 출시
- 키움증권, ‘제18기 고객패널’ 모집
- 신협, 임직원 참여형 ESG 자원순환 캠페인 실시
- NH농협은행, 기업ERP서 금융업무 가능한 'NH임베디드플랫폼' 오픈
- 헬스케치, ‘스타브랜드 대상’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부문 대상 수상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KB국민카드, 겨울방학 맞이 해외호텔 예약 할인 진행
- 2셀트리온,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 캐나다 허가
- 3서울 노원구 디지털바이오시티 개발 본격화…더블역세권 ‘노원 스타파크리움’ 주목
- 4바이킹랩, 韓 최초 히어로 ‘라이파이’ 생성형AI 기술로 부활
- 5남원추어 미꾸야, 신제품 ‘남원추어 온추어탕’ 출시
- 6크나우프 석고보드, 포항서 ‘희망의 집짓기' 활동 진행
- 7더 퍼펙트 코리아, 반려견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한 ‘퍼펙트 펫 보험’ 출시 예고
- 8코스알엑스, 5 PDRN 스킨케어 라인 정식 출시
- 9신한라이프,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 10소로, 저속노화 솔루션 ‘제로 오미자샷’ 출시 3개월 만에 1차 물량 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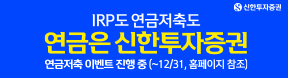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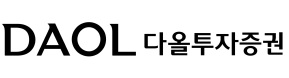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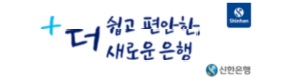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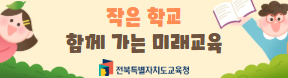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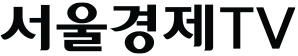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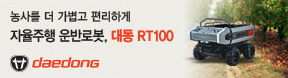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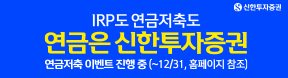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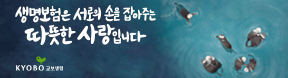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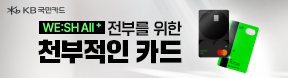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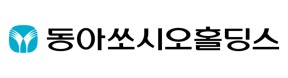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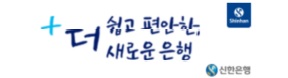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