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만 지분인수 관심"… 민영화 지연에 경쟁력 약화 불보듯
증권·금융
입력 2015-07-14 18:01:47
수정 2015-07-14 18:01:47
이혜진 기자
0개
[본문 리드] 정부가 우리은행 매각 추진을 잠정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우리은행 민영화 시도는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갔다. 당초 정부는 5~6월 매수 수요를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7월 중 매각 시기와 방법을 결론 내겠다는 입장이었다. 조속한 민영화 추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수요 부족으로 인해 매각 일정을 짜기가 힘들다는 게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은행 민영화가 지연되면서 상업은행으로서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년에 마땅한 대안이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특히 금융권이 '빅4' 금융지주사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독자 생존해야 하는 우리은행의 기업 가치는 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민영화를 위한 몸집 줄이기 차원에서 자회사였던 증권사와 지방은행·보험사를 매각한 반면 통합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는 각각 외환은행과 LIG손해보험(KB손보) 합병을 마무리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업에만 의존해 성장해야 하는 우리은행의 수익력은 장기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매각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대주주를 찾아 매각하는 방식이 모두 무산되자 올 들어 정부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1%를 약 4~10%씩 쪼개 과점주주에 파는 방안을 놓고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30%를 민간에 매각한 후 주가가 오르면 나머지 지분을 팔아 공적자금 원금을 회수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예금보험공사 고위관계자는 "30%에 달하는 지분을 팔기에는 투자자 수요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물량을 시장에 팔 경우 주가가 더 하락해 회수할 수 있는 공적자금이 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은행 주가는 주당 9,500원선으로 공적자금 회수 원가인 1만3,500원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또 투자자 구성 역시 걸리는 부분이다. 당초 당국은 국내외 연기금, 해외 국부펀드 등 장기 투자자들이 들어오기를 희망했으나 해외 사모펀드(PEF) 등 단기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자본들만 매수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론스타의 행태에서도 경험했듯이 PEF들은 은행의 장기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이나 해외 투자보다는 배당확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일부 투자자들은 미래 주가 하락시 방어장치(풋백옵션 등)가 있어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위 고위관계자는 "국내 연기금도 아닌 투자자들에게 정부가 주가 하락시 보장해주겠다는 장치까지 걸어가면서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매각을 추진하기 힘든 만큼 앞으로 우리은행 지분 가치를 올리는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수요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발표할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서는 향후 투자자 수요 조사 계획과 민영화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를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지만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매각 이후 주가가 오를 경우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정권 차원에서도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낼 수 있는 대형 시중은행을 민간에 넘기는 일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정부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낸다는 논란에 휩싸였으며 최근에도 상당수 사외이사들을 정치권 인사로 채워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갈수록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에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3대 민영화 원칙 중에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재입법안을 논의해야 민영화 물꼬를 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핀다 "자담대, 카드사 포함 전 업권 입점…올해 한도조회 4480만건 달해"
- 삼성화재, 다이렉트 '4계절 보험' 겨울플랜 출시
- 농협 'K-라이스페스타' 개막…국산 쌀 소비 확대 나선다
- ‘실적 훈풍’ 증권가 CEO 연임 무게…변수는 내부통제
- BNK금융 회장 후보군 4인 압축…연속성 VS 변화 경쟁
- 서스틴베스트, 국내 공시 위한 ‘재무중요성 맵’ 최초 공개
- 핀트, AI 투자 알고리즘 '미국 거버넌스' 부각
- 금감원, 홍콩ELS 판매銀 5곳 과징금 2조원 사전통보…역대 최대 규모
- 교보생명, 실종취약계층·사회복지사 맞춤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인터넷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 대출 목표 초과 달성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45일간 빛의 마법'…'2025 함평 겨울빛 축제' 개막
- 2순창군, 제18기 농업농촌혁신대학 졸업식 개최
- 3장수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 4장수군,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서 '장관상' 수상
- 5핀다 "자담대, 카드사 포함 전 업권 입점…올해 한도조회 4480만건 달해"
- 6삼성화재, 다이렉트 '4계절 보험' 겨울플랜 출시
- 7다음, 카카오 품 떠난다…부활일까 고별일까
- 8통신사, 주파수 재할당 ‘쩐의 전쟁’…결국 국민 몫?
- 9'롯데렌탈·SK렌터카’ 결합 임박…VIP운용 “주주환원”
- 10농협 'K-라이스페스타' 개막…국산 쌀 소비 확대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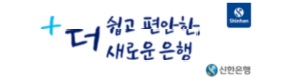
















































댓글
(0)